2025. 5. 9. 12:19ㆍ서비스디자인/서비스디자인 소식
공공디자인, 중앙정부를 넘어
Public Design Beyond Central Government Report 2025
핵심 인사이트 및 권고안
2025년 5월 7일
영국 디자인카운슬 Design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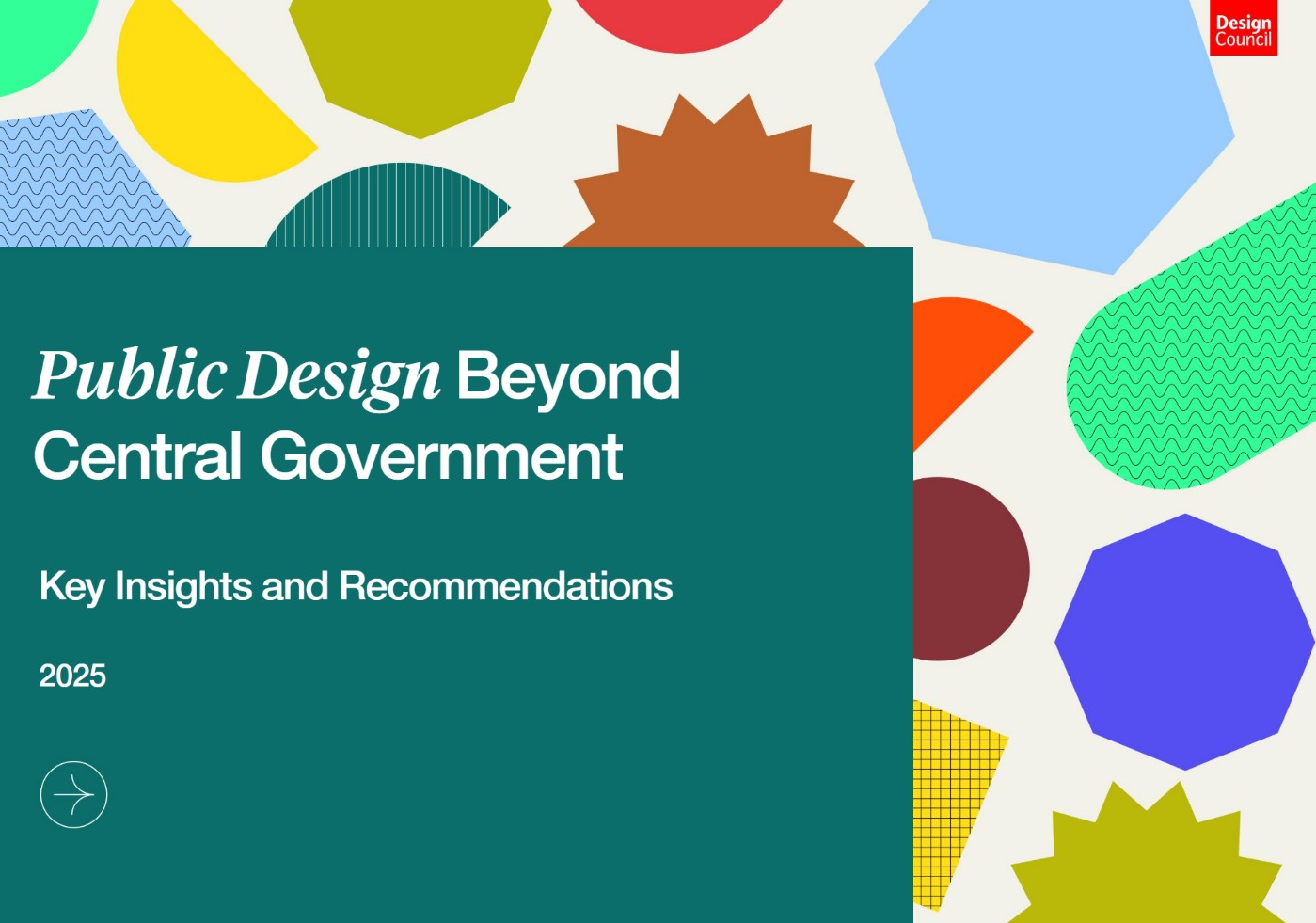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역은 서비스와 프로세스 개선(71%)이다.'
'지방정부 50%가 내부에 서비스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비전문 디자이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58%는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그중 전문가라고 자신한 비율은 13% 뿐이었다.'
'디자인은 여전히 공공서비스 설계 및 실행에 있어 위험한 방식으로 간주된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들을 밀접하게 참여시키는 방식은 조직에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중앙정부에서 30%, 지방정부에서 23%가 이러한 문화적 저항을 느낀다.'
...
영국 지자체,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설문 응답 결과
보고서 중에서 발췌
* 이 글은 영국 디자인카운슬이 2025년 5월 발표한 'Public Design Beyond Central Government Report 2025' 보고서를
AI로 번역한 글입니다.
머리말
디자인은 공공서비스에 상당한 가치를 더한다. 이는 정책과 서비스가 어떻게 개발되고 전달되는지를 형성하며, 시민, 지역사회,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사람과 지구가 함께 번영하도록 돕는다.
지난 30년간 디자인은 영국 공공부문 곳곳에 뿌리내리고 성장해왔다. 지방자치단체, NHS(국민보건서비스) 시스템과 트러스트, 그리고 주택, 경찰, 소방 등의 비부처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2007년 설립된 켄트 사회혁신랩(SILK)과 같은 초기 개척자들을 시작으로, 디자인카운슬과 지방정부협의회(LGA)의 10년 공공부문디자인 프로그램은 1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NHS 트러스트에 디자인 사고를 도입하며 그 성장을 이끌었다. 오늘날 캠든 자치구처럼 정책 디자이너를 자체 고용하는 조직도 등장하며, 디자인은 지역 공공부문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지역 수준에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더 용이하다. 서비스는 매일 지역 주민과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소통, 수요 파악, 개선안 테스트가 용이하다. 또한 지역 현장은 국가 정책 디자인의 시험대이자 피드백 루프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지금 영국 공공부문은 국가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며 큰 압박에 놓여 있다. 향후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NHS나 아동 특수교육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는 대중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디자인 역량을 사치로 취급하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 디자인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절실한 자산이다. 디자인 역량을 활용하면 재정 제약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공공서비스를 더 민첩하고 집중력 있게,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지역사회와의 신뢰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요소와 촉진요소를, 디자이너와 비디자이너를 포함한 공공부문 리더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지역 수준에서 디자인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 공공부문 전 직원의 기본 디자인 역량, 조직 내 디자인팀 내재화, 증거 수집 및 모범사례 공유, 부문 간 디자이너 연결 강화 등을 제시한다. 디자인은 조용히 우리 사회의 공공서비스와 공간에 스며들고 있다. 이제는 그것을 세계적 역량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키워야 할 때다.
매튜 테일러 (NHS 협의회 CEO)
목차
- 요약
- 01 서론
- 02 디자인 실천과 가치
- 03 디자인 분야
- 04 미래 비전
- 05 성공의 장애요인
- 06 권고사항
- 07 부록
요약문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의 활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제 디자인은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거버넌스 개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공공부문 종사자의 88%는 디자인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한다.
이 보고서는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 NHS(국민보건서비스), 경찰, 응급서비스 및 기타 공공기관 전반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망한다. 이는 디자인카운슬의 ‘디자인 이코노미(Design Economy)’ 연구의 일환으로 2022년에 공공부문 종사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23~2024년에 공공디자인 리더 32명이 참여한 두 차례의 참여형 워크숍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영국 행정공무원 조직이 수행한 ‘2025 공공디자인 리뷰(Public Design Review)’의 기초 자료가 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한 세대에 한 번 이뤄지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었다.
디자인카운슬은 지난 20년 이상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의 활용, 효과, 가치를 평가하고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온 중심기관이다. 본 보고서의 권고안은 지방정부협의회(LGA), 네트워크레일(Network Rail), NHS 등과의 협업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오늘날 디자인의 가치와 실천
디자인은 시민, 지역사회, 사용자 중심의 정책 개발, 서비스 전달, 장소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디자인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부문 응답자의 31%는 디자인이 조직 전략의 핵심이라고 답한 반면, 민간은 22%에 그쳤다.
디자인은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한다.
- 사람 중심(people)
공동생산과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사용자 중심 접근을 제공하며, 변화를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간다. - 조직 역량(organisations)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고, 공동 비전 설정을 지원하며,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다. - 시스템과 장소(systems and places)
위기에 반응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시스템 사고와 예방 중심 접근을 장려한다. 장소기반 디자인은 사람들이 서비스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구성한다.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실천은 주로 비전문가들이 사용자 조사, 여정 맵핑, 프로토타이핑 등 디자인 도구를 활용해 수행한다. 응답자의 58%는 디자인이 자신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전문가라고 자처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러한 ‘디자인의 민주화’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더 강력한 전문가 리더십도 요구된다.
공공디자인의 미래 비전
디자인의 더 큰 가치를 실현하려면, 디자인은 성숙한 구조를 갖춘 핵심 공공 기능(core public function)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디자인 중심의 미래 공공부문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각급 조직에 디자인 리더십 체계 도입 (예: 디자인 책임자)
- 서비스, 장소, 정책 개발 전반에 걸쳐 고품질 공동디자인(co-design)이 일상화
- 공공부문 전반에 디자인 리터러시 확산
- 전문성과 위상을 갖춘 공공디자인 직능으로의 제도화
- 부서와 전략 전반에 걸쳐 내재화된 통합 디자인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강력한 협업 구조
- 데이터, 거버넌스, 조달,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한 디자인 품질 인프라 구축
주요 장벽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디자인은 아직 조직의 핵심 자산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 28%는 경직된 조직 프로세스를,
- 23%는 위험 회피 조직문화를,
- 28%는 디자인 리더 부족을 장벽으로 지목했다.
- 디자인 예산은 감소 중이며(25%), 전문기술 역량도 부족하다(19%).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이에 상응하는 투자, 역량, 리더십은 여전히 부족하다.
권고사항
앞으로의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핵심은 통합(coherence), 일관성(unity), 품질(quality)이다. 이에 따라 다음의 6가지 권고안을 제안한다.
- 디자인 리더십 강화
공공기관 전반에 최고디자인책임자(CDO) 등 시니어 역할을 배치하여 조직 내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것 - 공공디자인 커뮤니티 구축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실무자와 챔피언을 연결하는 교육, 툴, 이벤트를 조성하여 기후위기 등 공공목표 대응 - 우수 실천 시범사업 추진
디자인 리뷰 패널, 공통 디자인 원칙, 이사회급 챔피언 등 구조화된 접근 방식 시험 도입 - 디자인 조달 개선
지방정부가 지역 디자인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조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원 - 디자인 인증 및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
- 디자인 인재 파이프라인 확대
디자인 교육 개혁, 고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견습·파견 프로그램 개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디자인 역량’ 포함
디자인카운슬은 지난 20년간 영국 공공디자인의 성장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기관으로,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이 권고안을 실현하고 사람, 공공재정, 지구를 위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01 서론
이 보고서는 중앙정부 이외의 공공디자인에 초점을 맞춘다. 지방정부, NHS, 경찰, 응급 서비스 및 기타 공공기관 전반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보고서의 기초는 2022년 디자인카운슬이 디자인 이코노미(Design Economy)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공부문 종사자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23~2024년에 실시된 공공부문 디자인 리더 32명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워크숍 2회이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 행정공무원 조직이 주도한 ‘2025 공공디자인 리뷰(Public Design Review)’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공공부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사실상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기회였다.
디자인카운슬은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의 활용, 효과,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역량 강화 지원에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은 지방정부협의회(LGA), 네트워크레일(Network Rail), NHS 등과의 협업 사례에서 도출된 것이다.
오늘날의 디자인 가치와 실천
디자인은 시민, 지역사회, 사용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서비스 전달, 장소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자인이 민간보다 전략적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 실제로 공공부문 응답자의 31%가 디자인이 조직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민간부문 응답자의 22%보다 높다.
디자인은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한다:
- 사람 중심
공동생산과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사용자 중심 접근을 제공하며, 변화가 시민 ‘대상’이 아니라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 조직 역량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촉진하며, 조직 간 공동 비전 수립과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한다. - 시스템 및 지역 기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시스템 사고 및 예방 중심의 접근을 촉진한다. 장소기반 디자인은 사람들이 서비스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구성한다.
공공부문의 디자인 실천은 대개 비전문가들이 사용자 조사, 여정 맵핑, 프로토타이핑 등의 도구를 활용해 수행한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의 업무에 디자인이 포함된다고 했지만, 전문가로 자처한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이러한 ‘디자인의 민주화’는 유익하지만, 전문 디자이너의 강력한 리더십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의 활용은 꾸준히 증가했다.
- 현재 공공부문 조직의 88%는 디자인이 자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 이는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 거버넌스 향상에 있어 디자인이 핵심 도구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하는 일에 디자인이 포함된다고 답했으며, 약 1/3은 조직 전략 수준에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02 디자인 실천과 가치
디자인 실천
많은 참가자들은 디자인이 공공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하며, 예방 중심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건축환경이나 인프라 같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중요하다. 이들 개입은 장소 기반(place-based) 접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 차원의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디자인과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은 중앙정부보다는 비중앙정부 기관에서 서비스 및 정책 개선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중앙정부 내 전략적 역할: 42%, 비중앙정부: 28%). 반면, 디자인이 서비스 및 정책 전달 개선에 있어 핵심이라는 응답은 비중앙정부에서 60%, 중앙정부는 49%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외부의 정책디자인이 보다 실행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디자인 실천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공동생산 및 시민 참여 촉진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 공동생산과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디자인 프레임워크는 지속 가능하고 목적 중심의 지역사회 참여 구조를 제공하며, 사용자와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여 조직의 평판 리스크도 줄여준다. - 사용자 중심 접근
공공의 실제 수요와 행동을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해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해법을 개발하게 해준다. 참가자들은 디자인의 가치를 ‘수요에의 반응성’, ‘사용자 경험 확대’, ‘삶의 경험에 대한 공감’, ‘다양한 관점 및 갈등의 드러남’으로 표현했다. - 지역사회의 주체성 확대
시민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변화가 아닌 방식으로 설계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주체성을 높인다. 참여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은 시민의 실제 수요에 더 적합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더 잘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이미 혹은 계획 중으로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응답했다. -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협업 기반 구축
디자인은 조직 내 다양한 부서 및 서비스 간에 공동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효과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디자인을 통해 조직은 실험과 테스트에 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업무 방식 도입에 열려 있게 된다. 중복을 방지하고 혁신을 위한 여백을 찾아내는 데 디자인은 핵심 역할을 한다. - 조직 간 연계 강화
디자인은 여러 공공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며, 목표 정렬과 공감대 형성을 돕는다. 결과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된 서비스 시스템이 형성되어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킨다. - 시스템적 관점 및 예방 중심 접근
디자인은 문제를 그 맥락 속에서 바라보며 단순한 증상 대응이 아닌 본질적인 원인을 다룬다. 이를 통해 사전에 개입하는 예방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문제의 전이가 방지된다. 참가자들은 디자인이 ‘위기가 오기 전 문제 해결에 개입’, ‘우리가 일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고 평가했다. - 장소 기반 접근
여러 디자이너들은 사람과 서비스, 환경이 한 장소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중심에 둔 ‘장소 기반 접근(place-based approach)’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디자인 실천이 만들어내는 결과들
디자인 실천은 단일 프로젝트의 목표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확장된 가치들을 창출한다:
- 비용 대비 가치 향상 및 효율 증대
조기 개입 및 시스템적 접근은 비용 절감 효과를 낳는다. 실험과 학습 중심의 접근은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44%는 디자인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며, 28%는 향후 이를 위해 디자인을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 리스크 감소
디자인은 수요를 깊이 이해하고 개입을 사전에 테스트함으로써 재정적, 평판 리스크를 줄인다. “틀린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보다 더 큰 공공 예산 낭비는 없다”는 한 참가자의 말은 이를 잘 요약한다. - 조직 내부 역량 강화
비디자이너를 디자인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내부 팀 역량이 강화되고, 디자인이 조직문화로 내재화된다. LGA와 디자인카운슬의 2018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93%가 동료에게 배운 디자인 접근법을 공유했다고 답했다. - 사일로 구조 해소
서비스 운영의 인사이트가 정책 디자인으로 연결되면서 조직 내 사일로 구조를 줄이고 통합된 접근이 가능해진다. - 공공 신뢰 증진
지역사회와 함께 디자인된 서비스는 사람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디자인은 기회를 발견하게 하며, 조직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
사례로 본 디자인 실천과 가치
디자인카운슬은 공공부문 조직들이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고,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지방정부협의회(LGA)와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9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 주거, 기후 위기 등 다양한 과제를 디자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다. 다음의 사례들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지역 자산의 재생 – 암블(Amble) 항구 사례
노섬브리아주 암블의 어항 재개발 과정에서 공동생산(co-production)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2010년, 암블의 최대 고용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2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요 산업부지가 공터로 남았다. 이에 따라 암블 개발 신탁(Amble Development Trust)과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카운슬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공동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디자인카운슬의 어소시에이트 닉 데빗(Nick Devitt)은 지역 기업, 관광청,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워크숍을 진행해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암블을 ‘음식 중심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여기에 현지 생산자들을 위한 소매 공간과 해산물 센터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2012년에는 ‘암블 2020’ 비전이 지역사회 주도로 발표되었고, 2014년에는 해안 커뮤니티 펀드로부터 180만 파운드를 유치해 소매 공간과 해산물 센터가 개관되었으며,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이 활성화되었다. 2015년에는 암블이 ‘올해의 하이스트리트’로 선정되었다.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출발 – 스태퍼드셔 사례
디자인은 스태퍼드셔 주에서 취약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2014년 당시 스태퍼드셔에서 아동보호계획의 대상이 된 아동 중 40% 이상이 5세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스태퍼드셔 주청은 지역 커뮤니티 기반 아동서비스 제공기관인 Spark CIC와 함께 디자인카운슬의 공공부문 디자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더 효과적인 조기 개입 방안을 탐색했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슈퍼유저, 비이용자,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심층 인터뷰가 이뤄졌고, 무료 이용권 제도가 낙인을 유발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자금 지원 방식이 Spark CIC가 ‘위험군’ 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가족 누구나 동일한 외형을 가진 멤버십 카드를 도입하고, 출석 기반 보상 구조로 재편함으로써 참여 시간은 300% 가까이 증가했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155명의 아동이 새롭게 서비스와 연결되었다.
문화적 연결성 개선 – 엘즈미어 포트 사례
체셔주의 엘즈미어 포트(Ellesmere Port)는 ‘하이스트리트 태스크포스(High Streets Task Force)’의 지원을 받아 문화시설과 여가공간 간 연결성을 높이는 장소기반 전략을 추진했다.
디자인카운슬은 지역의 성공 요인과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공동 비전 수립 워크숍을 주도했다. 참가자들은 엘즈미어 포트가 소매업과 문화시설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활동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우선순위 도출을 통해 새로운 문화 전략과 시빅스퀘어(Civic Square)의 공간 재구성을 주요 개입점으로 설정했고, 이후 Whitby Hall을 세계적 수준의 예술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인근 유동 인구가 최대 30% 증가했다.
직장 내 만성질환 예방 – 런던교통공사(TfL) 사례
2020년, 런던교통공사(TfL)는 19,000여 명의 운영직 직원의 장기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직장 건강 서비스를 재검토했다.
TfL은 디자인카운슬의 ‘직원 건강 및 혁신 기금 프로그램(Employee Health and Innovation Fund)’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사전 건강검진 데이터 분석 결과 20% 이상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정신건강 문제로 GP(일반의사)에게 의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조사, 기회 맵핑, 비전 설정, 프로토타이핑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을 확인했고, 다수의 직원이 보건부서에 대한 불신과 예약 접근성의 불편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후 시범적으로 이동형 건강 진료차량이 도입되어 7개 지역에서 총 412건의 건강검진이 실시되었고, 커뮤니케이션 전략 재설계를 통해 보건부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TfL 보건 책임자는 “타 부서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직원들 역시 45분 건강검진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다”고 평가했다.
03 디자인 분야
설문조사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와 적용 방식에 대한 주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 응답자의 59%는 공간과 장소를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을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71%는 서비스와 프로세스 개선에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47%의 응답자는 정책 디자이너를 내부에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 건축 및 건설환경 전문가를 내부에 두고 있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 서비스디자인은 특히 지방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50%가 내부에 서비스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두 가지 핵심 논점
1. 비전문 디자이너의 역할 확대
공공부문은 비전문 디자이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체 공공부문 인력 중 전문 디자이너는 5%에 불과하지만, 20%는 실제 업무에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응답자의 58%는 디자인을 업무에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그중 전문가라고 자신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공식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디자인 사고를 적용하는 실무자(디자인 챔피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반화된 디자인 접근의 확산은 그래픽디자인, UX디자인, 건축디자인 등 전문 기술 기반 디자인 분야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전문화된 디자인 스킬과 일반적 접근 방식 간 균형을 잡는 것이다.
2. 디자인 간 통합과 장소 중심 접근의 강화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정의한 디자인의 가치와 실천 방식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 간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 특히 중앙정부 외부에서는 장소(place)와 물리적 공간의 디자인이 정책 및 서비스 디자인과 통합되어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도시디자인이 생각보다 더 깊게 공공부문 전반에 통합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 정부에서는 서비스와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공간 설계와 물리적 기반 인프라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시
- Secured by Design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정책)은 경찰, 지방정부, 도시디자인을 통합하여 물리적 공간을 재구성한다.
- 네트워크레일(Network Rail)은 물리적 설계, 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을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 High Streets Task Force는 도시 중심부 재생을 위한 전략 수립에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다.
04 미래를 위한 비전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공공디자인 리뷰(Public Design Review)’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가정하고,
2035년의 공공디자인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핵심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1. 강력하고 다학제적인 디자인 리더십이 조직 전반에 존재한다.
-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다.
- 각 지역/도시 수준에는 디자인 책임자(Head of Design)가 존재한다.
- 비디자이너 출신 리더들도 조직 내에 디자인 역량을 확보하고 확산시키는 데 적극적이다.
- 새로운 세대의 지방정부 리더 및 최고경영자들은 디자인을 핵심 역량으로 인식한다.
2. 디자인은 시민을 서비스 및 정책 개발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 공동디자인(co-design)은 조직 전반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기본 방식이 된다.
- 시민 및 지역사회와의 공동디자인이 표준이 되고, 디자인은 권한의 공유 수단이 된다.
- 인간 중심적 서비스를 설계하고, 지역사회 주도권을 강화한다.
3.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는 디자이너처럼 사고할 수 있다.
- 공공부문 전 직원이 디자인 사고에 대한 기본 역량과 디자인 리터러시를 갖추게 된다.
- 그래픽디자인, UX디자인 등 전문화된 기술 역량 역시 존중되고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4. 공공서비스 프로젝트는 테스트와 반복(Iteration)이 전제된다.
- 테스트와 반복 설계는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되며, 문제 정의 및 아이디어 개발 단계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
- 디자인은 보다 전략적이고 덜 반응적(reactive)인 도구가 된다.
- 프로젝트 초기에 문제를 정확히 설정하고 방향을 정함으로써, 전체 사업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5. 디자인은 모든 공공조직에 존재하는 ‘전문 직능’이 된다.
- 리서치 직능과 유사하게, 디자인은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존재하는 역할이 된다.
6. 디자인은 조직 전반에 통합되어 작동한다.
- 디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이너는 조직의 전 영역에서 통합되어 있으며,
- 프로젝트와 전략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활발히 참여한다.
- 다학제적 디자인 접근이 일반화되고, 부서 간 경계는 흐려진다.
- 시민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툴킷으로 디자인이 활용된다.
7. 디자인은 ‘상류 단계(Upstream)’에서 사용된다.
- 정책 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이 핵심적으로 활용된다.
- 현상 유지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위한 도구로 자리 잡는다.
- 예방적 접근이 강화된다.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디자인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 양자 간 상호 연결적이고 순환적인 구조가 자리 잡는다.
- 중앙정부가 개발한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프로토타입을 통해 실험되고 개선된다.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디자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지방정부는 이에 부응하는 전략적 디자인 역량을 확보한다.
9. 데이터와 증거 기반이 디자인 성장과 효과를 뒷받침한다.
- 사용자 데이터와 리서치는 디자인의 효과를 증명하는 기반이 된다.
- 조직들은 데이터를 공유하며 시민 수요와 행동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구축한다.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모델링, 테스트,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10. 모든 정책과 서비스에는 ‘디자인 검토(Design Review)’가 내재화된다.
- 모든 프로젝트, 서비스, 정책은 디자인 프로세스와 원칙을 준수한다.
- ‘디자인 리뷰(Design Crit)’는 필수 절차로 자리 잡고,
- 공공조직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원칙을 교육하며, 변경관리를 통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11. 모든 조달이 좋은 디자인의 가치를 반영한다.
- 조달 담당자들은 높은 수준의 디자인 리터러시를 갖추게 된다.
- 얼라이언스 계약 모델(Alliance Contracting)을 통해 조달 과정에서 설계 적합성을 조기에 검토한다.
12. 지속적인 디자인 역량 강화와 도구 제공이 이뤄진다.
- 디자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예: LGA의 공공부문 디자인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 디자이너들은 업무에 필요한 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05 성공의 장애요인
디자인카운슬의 설문조사 및 공공부문 프로그램에 대한 과거 평가 결과는, 공공부문 내 디자인의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이를 촉진하는 요인, 그리고 잠재적인 기회를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연구 결과는 디자인 접근법에 대한 관심과 채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디자인은 핵심 비즈니스 기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 장애요인은 디자인의 장기적 확산을 방해하고 있다.
1. 경직된 조직 프로세스와 구조
디자인의 생성적이고 탐색적인 접근 방식은 공공부문 표준 운영 방식과 자주 충돌한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초기에 고정된 산출물을 정의해야 하거나, 시민 참여에 대해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한 점 등이 그렇다.
- 전체 응답자의 31%는 이를 주요 장벽으로 꼽았다.
- 중앙정부 내에서는 41%, 중앙정부 외부에서는 28%가 해당 장벽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문제:
-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 반복과 수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보다 산출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조달 및 계약 시스템이 디자인 중심 업무를 어렵게 만든다.
- 데이터 보호 규정: 커뮤니티와의 협업, 피어 러닝, 공동설계 등에 제한이 많다.
- 중앙-지방정부 간 접근 차이: 중앙정부는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 방식을 따르는 반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된 디자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혁신 공유 및 확장이 어려움.
2. 위험 회피 조직문화
디자인은 여전히 공공서비스 설계 및 실행에 있어 위험한 방식으로 간주된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들을 더 밀접하게 참여시키는 방식은 조직에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 중앙정부에서 이 문화적 저항은 30%, 지방정부에서는 23%가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저항 요인:
- 공동디자인에 대한 근거 부족: 공공부문에서 공동설계를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인식. 이는 때로 예상치 못한 결과와 계획의 근본적인 재설정을 초래한다.
- 디자인 인력 채용 유연성 부족: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을 고용하거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음.
3. 리더십의 인식 부족 또는 의지 결여
리더가 디자인을 적극 지지할 때, 디자인은 조직 내에서 활력을 얻는다.
- 중앙정부에서는 52%의 리더가 디자인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나,
- 지방정부는 47%, NHS는 37%로 낮았다.
- 2022년 설문조사에서 28%는 ‘리더의 인식 부족’을 명확한 장벽으로 지목했다.
구조적 원인:
- 성과 지표가 산출물 중심: 리더들은 결과보다는 양적 산출물로 평가받기 때문에, 디자인을 프로젝트 초기에 도입하지 않고 뒤늦게 투입해 고비용 회피 설계가 반복됨.
- 리더들의 사용자와의 거리감: 리더들은 대개 최종 사용자와 거리가 멀고, 현장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접 정보로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 ‘디자인’의 폭넓은 정의: 디자인이 너무 넓게 정의되어 있어, 비디자이너들은 서비스디자인의 구체적 가치를 인식하기 어렵다.
4. 낮은 예산 및 투자 부족
예산 문제는 특히 지방정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지난 5년간 디자인 예산이 줄어든 지방정부는 21%였고, 늘어난 곳은 16%에 불과했다.
-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이 더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
- 전체 응답자의 25%는 ‘예산 부족’을 디자인 확산의 주요 장애로 꼽았다.
주요 결과:
- 축소된 일정과 과정: 예산 제약으로 인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문제 이해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고, 설계 시간이 축소된다.
- 인재 확보 어려움: 비디자이너 교육 및 전문 인력 채용 모두에 제약이 있으며, 외부 전문가 활용도 제한되어 장기적인 역량 축적이 어려움.
5. 기술적 디자인 역량 부족
디자인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역량이자, 동시에 훈련이 필요한 전문 기술이다.
- 전체 응답자의 60%는 “디자인 관련 채용이 5년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 중앙정부 외부의 19%는 ‘기술적 전문 디자인 인력 부족’을 장벽으로 지목했고, 중앙정부는 9%였다.
핵심 원인:
- 소규모·범용 중심 디자인팀이 많아, 전문성 있는 디자이너를 채용하거나 조달할 여력이 부족함.
- 공공부문에는 디자인을 위한 정식 훈련 경로가 존재하지 않음. 견습 제도가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비함.
- 외부 의존도 과다: 내부 디자인팀의 전문성 향상 기회를 줄이고, 결과물의 맥락 이해도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음.
- 사내 디자이너 과부하: 공공임금체계로 인해 민간과 경쟁하기 어려워,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큼.
- 다양성과 형평성 문제: 디자인팀이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디자인 직업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6. 디자인 조달 및 계약의 어려움
조달은 중앙정부에서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 중앙정부 응답자의 22%는 ‘디자인 조달의 어려움’을 지적한 반면,
- 중앙정부 외부에서는 13%였다.
이는 중앙정부 외부는 외부 조달보다는 내부 역량 부족이 문제임을 시사한다.
구체적 장애:
- 조달 인력의 디자인 이해 부족: 낮은 이해도로 인해 잘못된 계약이 체결되거나 아예 디자인 조달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재설계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 결과물 중심의 계약 구조: 디자인은 문제를 재정의하거나 도전적 과제를 다루기 위한 접근이지만, 현재의 조달 방식은 이를 제약함.
- 디자인을 '사치'로 간주: 예산 삭감 시 가장 먼저 줄어드는 영역이 디자인이며, 이는 실험과 혁신을 막는다.
보다 넓은 시사점
중앙정부 내부에서는 디자인을 활용할 자신감, 동기, 기회 부족이 장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 외의 공공부문에서는 디자인 활용 의지와 흥미는 충분히 존재했다.
실제 장벽은 조직 구조 깊숙한 곳에 존재한다.
리더십 모델,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력 개발 시스템, 투자 구조가 현재 디자인이 더 강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시스템을 재편하지 않으면, 디자인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한다.
06 권고사항
이번 장에서는 ‘공공디자인 리뷰(Public Design Review)’ 및 그 이후의 정책·조직 변화에 적용 가능한 6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이 권고안은 특히 중앙정부 외부에서 디자인을 이끌고 있는 실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01. 디자인 리더십 강화
- 모든 공공기관에 최고디자인책임자(Chief Design Officer) 또는 시니어급 디자인 챔피언을 배치해야 함.
- 이들은 실무 중심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보조금 지원형 교육 및 지식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는 3~5년 단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배경: 현재 공공기관 중 디자인 의사결정자를 명확히 둔 곳은 40%에 불과함(민간은 63%). 네트워크레일(Network Rail)의 시범 사례는 리더의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02. 공공부문 디자인 커뮤니티 구축
- 공공디자인 실무자들을 연결하는 이벤트, 교육, 자료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구성 예시:
-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 프레임워크 및 도구 접근권
-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연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 실무자 및 리더 모두를 위한 기후위기 등 주요 공공과제 대응형 디자인 훈련
배경: 현재 공공디자이너들은 고립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 간 정렬이 부족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분야 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
03. 우수 디자인 실천사례 시범사업 추진
- 3~5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공공서비스 내 디자인 품질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측정해야 함.
시범 구성 요소:
- 디자인 리뷰 패널
- 공통의 디자인 원칙
- 이사회 차원의 디자인 챔피언 제도
배경: 건축 및 도시설계 분야에서는 디자인 코드와 리뷰 패널 등 이미 검증된 품질 확보 메커니즘이 있음. 이를 서비스·정책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음.
04. 공공디자인 조달 프레임워크 마련
- 공공기관이 서비스 및 정책디자인 전문 기업과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형 조달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함.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 결과 중심의 입찰 템플릿
- 지역사회 참여 가이드
- 공급업체 협업 및 파견(Secondment) 지침
- 디자인 성과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도구
배경: 조달 개선은 고품질 디자인 확보의 핵심이다. 현재 정책은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민간 디자인 생태계와도 단절돼 있다.
05. 디자인 인증 및 역량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공공부문 내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디자인사고를 활용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공인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이를 더욱 확산시켜야 함.
추진 내용:
- 훈련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 교차분야 디자인 역량 프레임워크
배경: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훈련이 일관되지 않아 오용되는 경우도 있음. 인증과 역량체계를 통해 투자 신뢰도를 높여야 함.
06. 공공디자인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일반 역량:
- 학교 교육과정에 ‘디자인과 기술’을 재도입하고, 다른 과목 속에 디자인 과제를 통합해야 함.
전문 역량:
- 디자인대학과 공공부문 간 연결을 강화하고, 졸업생 채용 프로그램, 견습과정, 파견기회 등을 확대해야 함.
배경:
- 공공부문은 고급 디자인 인재를 내부에서 보유해야 하며, 구조화된 경력 경로를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유지할 수 있어야 함.
07 부록
다음은 본 보고서의 연구 개발에 참여한 워크숍 참가자 및 분석 기여자 명단이다.
워크숍 및 연구 기여자
- Alejandra Diaz
런던 캠든 자치구, 정책 및 서비스디자인 책임자 - Allison Savich
스포츠잉글랜드, 디지털 및 혁신 전략 총괄 - Almira Lardizabal Hussain
런던시청, 혁신 및 협업 정책·프로그램 책임관 - Andrew Knight
영국 정책디자인 커뮤니티 대표 - Andrew Elliot
레스터셔 경찰청, 변화관리 책임자 - Anna Mclean
로몬드 및 트로삭스 국립공원, 참여 및 혁신 담당 이사 - Anthony Dewar
네트워크레일, 건축 및 시설디자인 총괄 - Aurelie Lionet
Futurice, 수석 서비스디자이너 - Beatrice Fraenkel
스톡포트 NHS 재단 신탁, 비상임이사 - Catherine Howe
아더 & 워싱 자치구, 최고경영자 - Ellen Vernon
LGA 공공자산 통합 프로그램, 프로그램 책임자 - Flora Newbigin
디자인카운슬, 지식총괄(직무대행) - Gemma Bone Dodds
스코틀랜드 국립투자은행, 전략자문 - Hannah Scothern
PwC,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 Helen Spires
영국 DWP 디지털, 디자인팀장(직무대행) - Ilse Bosch
NHS 연합회, 정책 부국장 - Jake Sumner
버밍엄 시의회, 수석 정책자문관 - Jessie Johnson
디자인카운슬, 지식책임자 - Jonathan Rez
영란은행, 서비스디자인 총괄 - Jonathan Lloyd
런던 월섬포리스트 자치구, 전략·변화 관리 국장 - Laura Smart
영국 경쟁시장청(CMA), 행동경제 허브 디렉터 - Nick Kimber
런던 캠든 자치구, 전략 및 디자인 국장 - Natasha Bhambhra
EY Seren, 시니어 서비스디자인 매니저 - Nayna Tarver
영국 에너지시장청(OFGEM), 정책 자문관 - Noel Hatch
아더 & 워싱 자치구, 인사·조직변화 부국장 - Paul Thurston
EY Seren, 디자인 디렉터 - Sadie Morgan
영국 국가인프라위원회, 위원장 - Serena Nüsing
영국 정책전문직종, 수석 서비스디자이너 - Shagun Seth
EY Seren, 지역공공서비스 부문 이사 - Simon Parker
사우스글로스터셔 카운슬, 전략국장 - Simon Woods
액센츄어, 공공서비스 디지털 책임자 - Sophie Dennis
Made Tech, 사용자중심디자인 책임자 - Tero Vaananen
NHS England, 디자인 총괄 - Will Steggals
크라운 에스테이트, 전략실행 총괄
보고서 제작진
저자
- Matilda Agace
- Bronwen Rees
- Cat Drew
- Dr. Irene Hakansson
- Josephine Ryan Gill
디자인
- Joana Pereira
사진 출처
- Mitchell Johnson (Unsplash, p.11)
- 암블 지역, 노섬벌랜드 (Pixabay, p.16)
- Alexandr Podvalny (Unsplash, p.16)
- ImaginePlaces (거리참여 이미지, p.17)
- Steve Bell (TfL 건강 밴 차량, p.17)
- Design Council (서비스 워크숍, p.18)
- Surrey County Council (반 고흐 산책로, p.20)
- Design Council (ExploreStation, p.20)
- Robin Howie @ Fieldwork Facility (팝업 공원 프로젝트, p.24)
- Jill Tate via Whittington Hospital (AMC 대기공간, p.31)
라이선스 안내
이 보고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디자인 > 서비스디자인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 세계 최고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를 찾습니다 — Service Design Award 2025 참가 안내 (0) | 2025.05.05 |
|---|---|
| 정책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 기본값을 다시 설정하라 (0) | 2025.04.25 |
|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전환, 디자인 기반 접근의 가능성과 과제 - 한국정책학회 정책디자인연구회, 4월25일(금) (0) | 2025.04.23 |
| 대전시 퍼블릭이즈 2025, 시민과 디자이너가 함께 만드는 공공의 미래 (0) | 2025.04.09 |
| 도쿄도의 만화형 가이드라인: 실무에서 배우는 서비스디자인 적용법 (0) | 2025.04.03 |
| 공공부문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모으기 시작했다! 변화의 현장, 제1회 공공기관공공디자인협의회 컨퍼런스 후기 (0) | 2025.03.01 |
